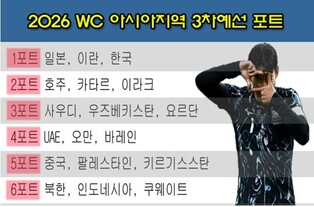텅 비어 버린 내 감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듣고 싶었던 음악을 찾아 볼륨을 한껏 높여 보지만… 갑자기 노이즈처럼 느껴지는 사운드는 이내 내 귓가를 어지럽히고 만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영화 리스트를 뒤적이다가 외친 “유레카!”
영화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은 바로 그런 감성충전기 같은 작품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미망인 캐리(제인 와이먼)와 정원사 론커비(록 허드슨)의 사랑이야기는 어느 청춘남녀의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건장하고 잘 생긴 젊은 남자와 자녀가 있는 중년여자의 사랑을 사랑 그 자체로 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신분과 계층,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마을 사람들에겐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일 수 밖에 없으며, 캐리의 자식들 역시 이에 예상되는 반대를 한다.
아들은 지금껏 지켜온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고, 딸 아이는 사랑에 빠진 엄마에게 근육질 남자에게 빠진 거냐며 힐난을 퍼붓는다.
세상의 시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족의 모습.
그들에게 있어 캐리는 단지 부르주아 계층의 유지를 위한 존재였고, 욕정에 빠져있는 속물 그 이상일 수 없었다.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세상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는 론커비와는 달리 그녀는 지켜야만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에 그녀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무게는 버거운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녀에게 자유와 사랑보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선순위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리라.
결국 사랑보다 세상의 시선에 자신의 선택을 맡겨버린 겁쟁이 캐리는 론커비와 헤어지고 만다.
하지만 홀로 남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줄 이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의 사랑을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던 자식들은 일로, 결혼으로 캐리의 곁을 떠나려고 한다.
눈물을 머금은 캐리의 모습은 무엇으로도 대신하지 못할 슬픔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그녀가 지켜야만 했던 돈과 명예, 자식들, 그 어디에도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론커비를 찾은 캐리, 엇갈리는 그들, 그리고 그의 사고…
손 내밀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라면 “사랑” 이란 두 글자가 그렇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리라.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돌아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되찾는다.
가족멜로드라마의 거장 더글러스 서크 감독은 1956년도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련된 영상미와 내러티브로 영화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을 연출했다.
사랑이라는 감상적인 소재에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선까지 함께 다루어 결코 가볍지 않은 감성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달리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듯 하다.
조건을 쫓는 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편견들일뿐, 서로 사랑하는 그들은 부유층의 미망인 중년여성도, 건장한 젊은 정원사도 아니다. 두 사람을 설명해주는 수식어는 이들의 사랑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수식어에는 어떤 것보다 가혹한 세상의 잣대가 들어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랑이 아닌 욕망이라는…이미 세상의 눈이 만들어버린 감옥.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그 외침은 공허한 울림이 되어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뿐이다.
과거의 난 모두에게 자랑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나 역시 누군가가 자랑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자랑 가능 한 수식어를 갖고 싶은 욕망에 휩싸였던 그때 사랑이란 게 눈에 보이기나 했을까?
맘에 두기나 했을까?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고 있는 건지, 아님 철이 덜 든 건지…지금의 난 과거 그토록 원했던 자랑거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 있다.(물론 완전히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삶이 그런 수식어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란 걸 터득할 수 있도록 해준 덕분일 게다.
때때로 그런 조건이 사랑이라고 우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체면에서 벗어난 경험 또한 이유가 되겠지?
가끔은 조건을 보고 크게 뜬 눈을, 아니 조건을 보기 위해 크게 뜬 눈을 질끈 감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멈칫하고, 포기하고, 멀리 돌아갔던 캐리와 내모습이 오버랩되는 순간,
살아가면서 론커비처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온전히 사랑으로 자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이 솟아난다. 그것이 단 한 순간일지라도…
론커비와 캐리처럼 “사랑 그대로의 사랑”으로 이 가을을 살아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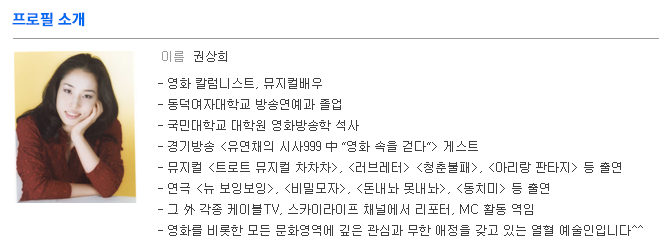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