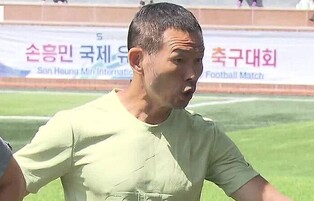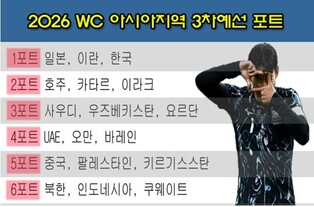어느순간 상상력의 범위가 좁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그 시덥지 않은 나이탓을 하고야 만다.
공연을 하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상상의 힘에 한계를 느끼는 건 실로 서글픈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쓰고 보니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 같은 걸)
무한대의 상상력을 자랑하던(?) 시기엔 스스로를 예술인이라고 자부했는데,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의 뇌구조를 느끼는 순간, 점차 생활인의 범주에 갇쳐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 내게 영화 <지구를 지켜라>와의 만남은 혹여 메말라버릴지 몰라 걱정하고 있던 상상력에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아! 정말 황당하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 강만식(백윤식)을 납치하는 병구(신하균)의 기이한 모습- 과연 이 영화를 계속해서 봐야 하나??? 쉽사리 적응이 될 것 같지 않다.
외계인이라면 어릴 적 보았던 감성적인
하지만 그 당혹스러움은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어 과연 이 비정상적인 캐릭터들의 조합과 낯설기만 한 스토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자못 궁금해졌다.
사회적 약자인 병구와 달리 그가 납치한 강만식은 권력집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 회사의 오너이자, 검찰총장의 사위, 총선의 신한당 후보 등 그의 막강한 타이틀은 그가 저지른각종 비리에 대해 면죄부가 되어준다.
하지만 병구는 여전히 그를 지구에서 인간들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외계인이라 믿고 온갖 기이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고문을 해댄다.
“넌 날 못 이겨”
의미심장한 이 한 마디의 말로 응수해 버리는 강만식.
마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간의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영원한 괴리감을 표현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해할 수 없었던 병구의 행동들은 그의 일기장을 통해 밝혀진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왕따였던 청소년기, 노동운동을 하다 죽은 여자친구, 일기장에 ‘죽어’ 라고 쓴 혈서, 엄마의 죽음, 그의 아픔에 일조했다는 자괴감에 소리 지르는 강만식의 모습이 플래시백과 현재의 모습으로 교차되면서 보여지는데- 그동안 기이하게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이상자에 가까웠던 병구의 모습에 이는 설득력을 부여한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 불행- 트라우마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 아픈 가슴을 어찌해야 좋을지……
병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투성이인 가슴을 보듬어 주고 싶다는…그것이 동정이 아닌 진정한 위로로서 다가서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생겨난다.
결국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게 해준다며 강릉공장으로 병구를 데려간 강만식.
“이제 지구는 누가 지키지?” 사력을 다해 지구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외마디…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주인공 병구는 강만식과의 혈투 끝에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다.
“넌 날 못 이겨” 라고 호언장담 하듯 했던 강사장의 말이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영화에서조차 현실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주인공 병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영화는 반전을 통해 보여준다. 안드로메다의 왕자인 강만식의 정체가 드러나며 이곳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그는 지구를 폭파시킨다. 검은 공간 속으로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지구와 우주에 퍼지는 Over the Rainbow의 아름다운 목소리, 작은 화면으로 보이는 행복했던 병구의 어린 시절이 아이러니하게 어우러지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일견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장면들은 경고를 담은 비극적 결말 속에서 그래도 버릴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지구를 지키는 일은 실패했지만 병구에게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작은 화면 속 어린 병구는 희망을 뜻하는 메타포로 완성된 것이다.
무한한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분방함으로 이루어진 걸작, <지구를 지켜라>를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별적인 쇼트에서부터 영화 전체에 이르는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이다. 청회색빛 화면, 마치 독일 표현주의를 연상시키는 듯한 독특한 미장센, 핸드헬드 등을 이용한 카메라 등 정교하게 계산된 미술과 촬영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현실과 판타지를 오간다.
하지만 영화적 테크닉 이면의 사회비판적인 시선의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약자인 병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은 결국 우주에서 바라 본 푸른 별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산산조각 나버린 지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폭파 후에도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은 여운을 남기며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이는 여전히 지구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지구는 누가 지키지?”
병구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할 때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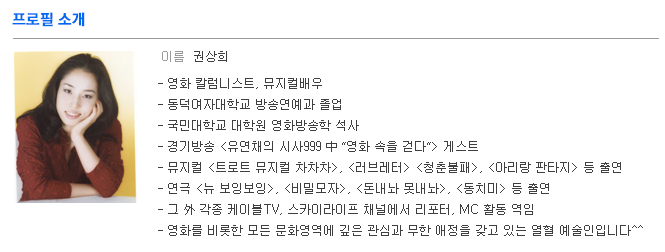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