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거울 속 얼굴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내게 듣고 싶지 않은 직언을 해주고 있지만......
음악이 가져다준 추억은 그렇게 영화 <레옹>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 레옹
빈틈없는 자기관리로 킬러로서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지만- 토니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고, 그를 믿고 그에게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맡기는- 한편으론 바보처럼 순진하고 한편으론 무미건조하기 이를 때 없는 삶을 사는 레옹은 철저하게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홀로 영화 Singing in the rain을 보며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은 그래서 더 쓸쓸하고 애처로워 보인다.
이따금 레옹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웃집 소녀 마틸다.
계모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소녀가 아닌,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린 듯한 모습을 한 아이. “사는 게 항상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래요?” 레옹에게 던진 이 질문이 그동안의 마틸다의 삶을 모두 말해주는 듯하다.
담배를 피우고, 비행청소년 스타일의 옷을 입은 아이는 이미 소녀로서의 순수함을 잃은 지 오래다. 킬러 일을 하지만 늘 우유를 마시고 혼자 영화를 감상하며 순수한 미소를 짓는 레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마치 아이와 어른이 뒤바뀐 듯한......
가족 모두가 스탠 일당에게 몰살당한 후 홀로 남은 마틸다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레옹은 마치 그녀의 수호천사 같다. 마틸다와 함께 하면서 웃음을 찾은 레옹.
하지만 그는 애써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이란 감정을 숨겨 놓은 채 마틸다를 위기 때마다 구해 주는 것으로 그 표현을 대신한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화분과 그녀만을 남겨놓은 채 스탠에 의해 죽어간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잠도 자고 뿌리도 내릴 거야. 절대 니가 혼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사랑한다, 마틸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참아왔던 말들을 마지막인 것처럼, 모두 쏟아내는 레옹에게서 그가 마틸다와 함께 하고 싶었던 미래와 희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느낄 수 있다.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그러나 마틸다를 만나면서 인간답게, 따뜻하게 살고자 했던 그의 바람이 모두 전해져오는 순간이다.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레옹은 누군가를 위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마틸다의 손에 의해 땅에 뿌리내리게 된 레옹의 화초...부유하던 그의 영혼이 마침내 뿌리 내려지는 순간이다.
파격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통속적인 소재를 저속하지 않게 그려낸 뤽 베송의 연출 능력은 가히 대단하다. 영화는 정해진 선을 벗어날 듯 보이다가도 이내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다.
뻔한 헐리우드식 액션 영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영화 레옹을 보고 난 후의 여운이 너무나 오래도록 남아있다. 슬프고 아픈,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하지만 20여년이란 시간의 간극 탓일까?
마치 레옹과 마틸다의 모습이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런 생각에 갑자기 쓸쓸해져옴을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나 스스로도 그런 사랑을 상상 속에서마저 배제하며 드라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건 나이 탓이야” 란 진부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어린 소녀 마틸다는 아니지만 내 곁에도 레옹과 같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미 오래 전 꿈꿨어야 할 소망을 늦바람이 분 것처럼 이제야 불쑥 떠올린다.
누군가 주책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갑자기 창 밖에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귀뚜라미 소리가 “사랑하기”를 재촉하는 듯 느껴진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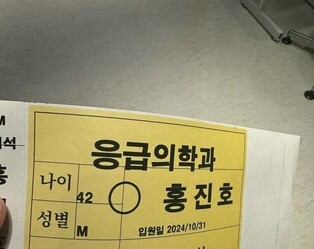































![[한스타연예인야구] 옹알스 최기섭, 선발투수 출격! 팬심까지 저격한 인기상!!](/news/data/20251017/p1065598509048949_255_h2.jpg)
![[한스타연예인야구] 배우 하도권 스토브리그 강두기 실제 야구 실력은?? 타격 모음.Zip](/news/data/20251017/p1065598446854673_478_h2.jpg)
![[한스타연예인야구] 드라마감독 한현희, 놀라운 타격감으로 팀 승리+MVP 수상!](/news/data/20251017/p1065598481884877_91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