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의 포수론] (7) 포수의 낭심보호대
 |
| 메이저리그에서는 포수, 투수, 야수 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낭심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헐크파운데이션) |
1982년 가을 프로야구 첫 해 인천에서 경기할 때 포수 마스크를 쓰고 수비하던 나는 상대 타자의 파울 팁에 급소를 맞고 쓰러진 적 있다. 당연히 보호대를 착용했지만 나중에 보니 보호대가 깨져있었다. 그 정도로 강한 타구를 맞았다. 얼마나 위험했던지…. 결혼을 몇 주 앞뒀었기에 그런 나를 보고 해설자가 몹시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2014년 4월 25일 SK 투수 윤희상이 롯데 김문호의 타구에 급소를 맞아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생생하게 중계돼 전국 남성팬들이 함께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다. Athletic Supporter(어슬레틱 서포터), 일명 ‘낭심 보호대’라고 하는 장비는 격투기 선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보호장비다. 내가 현역에서 뛸 때도 포수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장비여서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착용했다.
전국을 돌며 재능기부 중인데 전체 미팅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낭심 보호대를 몇 명이나 차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차지 않고 있어 깜짝 놀랐다. 꼭 차야 할 포수들까지 한 명도 차지 않았다. 아무리 연습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착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폭염일 때 낭심 보호대를 차면 사타구니가 쓰라리고 아파서 착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낭심 보호대는 어린시절부터 늘 착용해서 습관을 들여야 한다. 포수가 불펜에서 공을 받을 때 낭심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낮은 공이 들어오는 경우 가장 먼저 낭심을 보호하기 위해 옆으로 피하게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투수들이 낮게 던지고 싶어도 낮게 던질 수 없다. 혹 포수가 다치기라도 하면 투수의 책임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투수들이 마음놓고 낮게 던지지 못할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한 후 좋은 점 중 하나가 보호대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착용시 불편한 점도 많았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가서 다시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제 선수가 아니니 당연히 유니폼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게 시카고 화이트삭스 동료 코치들은 ‘왜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가. 다음부터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포수 뿐만 아니라 야수들 심지어 코치들까지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 보호대다. 포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투수 역시 반드시 보호대가 필요하다. 홈플레이트부터 투수 마운드까지 18.44m 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140~150㎞의 공이나 부러진 배트가 날아온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해야만 한다. 야수들도 보호대 덕분에 수비할 때 뿐만 아니라 주루 플레이때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작은 장비인 서포터는 안전도 보장하지만 더 나아가 허슬플레이에도 큰 구실을 한다는 것을 메이저리그에서 느꼈다.
미국에서 선수들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을 9년 동안 늘 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포수 외에는 착용하는 선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프로야구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 했고 화려하게 바뀌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 지켜져야 한다. 특히 유소년 야구 지도자들이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잘 지도해주길 부탁한다.
[이만수 전 SK 감독, 헐크재단 이사장]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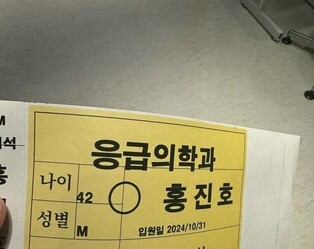































![[한스타연예인야구] 1루수이자 4번타자! 배우 김명수, 맹활약으로 인기상 수상!!](/news/data/20251120/p1065601506017242_316_h2.jpg)
![[한스타연예인야구] 영화감독 장진, 3타수 2안타! 감독님이 이렇게 잘한다고!](/news/data/20251120/p1065601557171680_769_h2.jpg)
![[한스타연예인야구] 강민혁 미쳤다! 3안타 전타석 출루로 MVP 수상!!](/news/data/20251120/p1065601469727763_944_h2.jpg)




